<아프리카의 꿈> ②대지의 목마름을 적시다
 |
KOICA 잔지바르 관개 사업..삶의 질을 높였다 (잔지바르<탄자니아>=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한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3년간 탄자니아 잔지바르섬의 키보콰 지역과 붐브위수디 두 곳에서 총 7.9km 길이의 간선용수로를 새로 짓고 650m를 복구했으며 560m의 배수로와 350m의 농로를 건설, 농업생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다. 사진은 주민들이 관개 수로가 설치된 곳에서 설명하는 모습으로 왼쪽은 잔지바르주 정부 농축환경부 관개전문가 쥬마 포움 씨, 오른쪽 가운데 선 이는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신소연 부소장. 2010.3.26 kjw@yna.co.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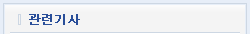
잔지바르 관개사업으로 쌀 2배 증산
"먹고 남는 것 팔아 아이들 교육"
(잔지바르<탄자니아>=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12일 탄자니아 동쪽 잔지바르 섬의 붐브위수디(Bumbwisudi) 외곽 농촌. 논둑 밑 수로에 사내 아이들 예닐곱 명이 발가벗은 채 시끄럽게 떠들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피부가 까만 아이들은 살을 벌겋게 달구는 뙤약볕도 아랑곳 않는다.
조금 있다 머리에 상아색 스카프를 두른 어린 여자 아이들도 작은 페트병을 한 개씩 들고 몰려와 얼굴을 씻고 물을 받아간다. 또 얼마 있다 조금 큰 아이가 자전거로 큰 물통 한가득 물을 실어 갔고 청년들은 소달구지로 큰 물통 여남은 개를 싣고 와 물을 길었다.
잔지바르는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 동북쪽에 있는 섬으로, 비행기로는 약 20분, 배로는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1천651㎢의 넓이에 인구는 약 110만 명이다. 면적은 제주도(1천847.77㎢ 약 80만명)보다 조금 작고 인구는 조금 많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붐브위수디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정 4개를 새로 뚫고 8개를 개보수한 뒤 시멘트 수로를 설치해 인근 논에 물을 대줬다. 잔지바르 관개시설 재건사업이었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전에 관정이 있던 곳으로, 협력단이 관정과 수로를 개보수하기 전에도 가정 용수는 그럭저럭 쓸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논농사가 그만큼 수월해졌고 소출이 늘었다는 점이다.
함께 현장을 찾은 잔지바르주 정부 농축환경부 관개전문가 쥬마 포움 씨는 "한국 정부가 수로와 펌프를 개보수한 뒤 생긴 큰 변화는 전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걸쳐 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에서 쓰는 물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지만 너른 농토에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개수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제때 모를 심고 땅을 적셔줘야 쌀이 잘 영그는데 전에는 적시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댈 수 없었다.
올해는 이달 초까지 계속된 약 석 달 간의 정전사태로 관정 시설의 효과가 반감되기는 했지만 전기가 다시 들어온 뒤에는 매일 약 10시간씩 펌프를 돌리며 250ha의 논에 물을 대고 있다. 펌프와 수로를 더 설치해 주면 560ha까지 경작 면적을 늘릴 수 있다 한다.
이곳 물사용자연합회(WUA) 대표인 쥬마 라마단 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에 도움을 청했다.
그는 "펌프와 수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고압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전력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사용자연합회는 정부와 손잡고 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 자치기구로 잔지바르 각 지역마다 활동하고 있다. 붐브위수디 물사용자연합회는 정부가 관개개발 마스터플랜을 시행한 지 3년 만인 2006년 조직됐고 현재 66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그에게 한국 정부가 지어준 관정 시설과 수로에 대해 묻자 대뜸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시설을 지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사업자인 한국농촌공사가 현지 업자에게 시행을 맡겼는데 이 회사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함께 이야기를 듣던 한국국제협력단 탄자니아 사무소 신소연 부소장은 나중에 더 상세히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현지 정부도 이 부분을 간과했던 모양이다.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현지 주민들이 한국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잔지바르의 또다른 협력단 사업 현장인 키보콰(Kibokwa) 지역에서도 주민들은 새로 설치된 관개시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3년 간 이곳과 붐브위수디를 합쳐 총 7.9km 길이의 간선용수로를 새로 만들고 650m를 복구했으며 560m의 배수로와 350m의 농로를 건설했다. 키보콰에는 경운기 5대와 트랙터 1대 등 농기계도 지원했다.
잔지바르 농축환경부의 라마단 부국장은 "이들 기계는 지금 잔지바르의 `제주'라는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한국국제협력단 초청으로 2주 간 한국을 다녀간 그는 한국에 제주도라는 큰 섬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관정 주변에 모여 있던 마을 주민들에게 "협력단 사업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고 묻자 이구동성으로 "전에는 1모작했는데 지금은 2모작한다"고 대답했다. 소출은 0.1 ha 당 200kg에서 500kg으로 배 이상 늘었다.
소출이 늘면서 생긴 생활의 변화를 물으니 "충분히 먹고, 남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었다. 그 덕분에 아이들 학교도 마음놓고 보내고 병원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전에는 대개 하루 한두 번 먹었는데 지금은 세 번도 먹는다"고 흥겹게 대답했다. 그 옆에 있던 이는 "벽돌집을 새로 지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은 "우수 종자를 수확해 비싸게 팔 수 있어 좋다"고 거들었다.
주민들은 또 멀리 보이는 논에서 괭이질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도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마단 부국장은 "한국 정부의 관개수로 사업은 공사시작단계에서, 또 더 넓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게 된 이후에도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계화가 덜 돼 일손이 달리면 사람을 사 농토를 일구는데 관개 수로가 설치된 이후 농사 면적이 훨씬 넓어져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말이다.
탄자니아는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농업에 의지하고, 노동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건조한 기후에 시설이 낙후돼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다. 빈곤인구의 약 87%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들은 대개 하루 한 끼나 두 끼를 먹는 경우가 많다. 식당에서 내놓는 밥 1인분 양도 엄청 많아 한국 사람들은 두 명이 먹어도 남는다.
잔지바르 주정부는 2003년부터 관개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약 8천521ha 규모의 전천후 경작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KOICA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라마단 부국장은 두 지역을 돌며 '식량안전'(food security)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잔지바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 사회적 안정성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말로 들렸다.
잔지바르 공무원들은 한사코 부인했지만, 이 곳은 1964년 사회주의 혁명을 경험했고 본토와 달리 무슬림 인구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본토 정부와 정치적 긴장이 남아 있다. 탄자니아는 연방공화국이다.
한국 정부는 또 잔지바르에 농산물가공훈련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망고와 바나나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상품화해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곳곳에 망고 나무가 자라고 있지만 제대로 된 냉동창고나 가공시설이 없어 상당량이 소비되지 못한 채 유실되고 있다.
잔지바르 농축산환경부 엔지니어링 담당 국장은 "한국에서는 망고 값이 얼마냐"고 묻고 "하나에 최소 3∼4달러(4천∼5천원) 한다"는 말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우리 밭에도 망고가 많이 열리는데 매년 헐값에 팔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어주는 농산물가공훈련센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잔지바르 관개개발은 1973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원조 사업으로 시작돼 1993년까지 약 400ha의 지하수를 개발했고 이후 일본 정부가 무상원조 사업으로 수로와 관정을 새로 설치한 데 이어 한국 정부가 뒤를 따르는 형국이다. 지금도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6명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봉사단원 6명이 잔지바르에서 함께 어울리며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관정 및 분수로(分水路) 등 하드웨어 지원을 끝내고 지금은 쌀 품종 개량 등 장기적인 협력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한다.
지난해 9월 농업 부문 봉사단원으로 이곳에 온 윤미영(25) 씨는 "이곳 농민들이 한국 농민들만큼 의욕은 없지만 같이 뭘 하자고 하면 잘 따라 온다"며 "지금은 유산균을 배양해 농사를 짓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생활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프리카의 꿈> 4봉사단원의3개월 정전 체험기 (0) | 2010.03.27 |
|---|---|
| <아프리카의 꿈> 3잔지바르 농축산부 사무차관 (0) | 2010.03.27 |
| <아프리카의 꿈> 1탄자니아 개발의갈증을 푼다 (0) | 2010.03.27 |
| <아프리카의 꿈> 8쓰레기더미에 핀 꽃`지라니` (0) | 2010.03.27 |
| 아프리카의 꿈7KOICA, 초등교육 의무화 지원 (0) | 2010.03.27 |



